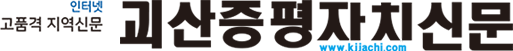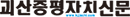난이 좋아서 40년을 함께한 사람

무상 종자 분양…난 문화 보급 앞장
개인 난실서 60여종 500여 본 배양
증평로 증천길 진지내 골목길로 접어들면 마당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다. 대문 앞에 서니 맑은 향이 들어오라 손짓하는 듯하다. 이곳이 증평에 난 문화를 보급시킨 김일회(80) 증평난우회 고문의 집이다. 그가 반갑게 안내한 곳은 난을 벗 삼아 40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난실이다.
아름다운 공간 '난실'
마당 한켠에 직접 마련한 난실. 지붕은 파이프를 얽어매 비닐로 덮어 비를 피하고, 담을 따라 가옥 사이를 막은 것이 전부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10m 정도의 안채와 담 사이에는 난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내손으로 만들었어요. 다소 엉성하지만 아름다운 나만의 공간이지요.”
그의 손길 속에 있는 난들은 모두 60여 종 500여 본이나 된다. 분재나 야생화 등도 60여 본이 있다.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하루를 거의 이곳에서 보내요. 나이를 먹어서인지 이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아쉽기도 하지요.”
화원 '청가원'서 난과 인연
그의 고향은 충주. 증평에서 자리 잡은 지도 벌써 50여 년이 흘렀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던 그에게 당시 '청강원'이라는 화원과 인연이 닿았다. 그때 마음을 빼앗긴 것이 바로 난이다.
“이끌림 - 그것이 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난을 접했을 때 그 묘한 울렁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치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느낌'에 이끌려 정신없이 빠져 들었다. 난을 배양하는 법을 배우려고 생면부지인 사람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누가 산채(산에서 난 종자 채집)를 간다면 무작정 따라나서서 배웠다. 당시엔 산채가 거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등에 이뤄졌다. 자주 산채를 다니다보니 경비가 많이 들어 주머니 사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마누라한테 많이 혼났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많이 봐줘요. 허허”
한국 춘란에 남다른 애정
그가 처음 난을 접했을 때는 취미생활이란 말이 어색했다. 다들 먹고 사는 일에 쫓기던 시절이었다. 난실을 꾸미고 난과 함께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곧게 퍼지는 잎마다 아름다움이 스며있고, 단아하게 피는 꽃에는 기품이 있죠”
그는 특히 한국춘란에 대한 애정이 깊다. 서양란은 화려하지만 한국춘란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좋다고 했다.
“잎의 무늬가 꽃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매력이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그는 난을 키우는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난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종자도 무상으로 분양하고 다른 지역 난인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었다. 그렇게 난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고 모임이 생기고 단체가 만들어졌다. 난 문화의 보급과 후계 양성을 위해 애쓴 결과다. 증평의 난인들에게 그는 스승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난실은 배움터였다.
“난을 통해 교분을 나눴지요. 지란지교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옛 선비들도 자신과 함께하는 난을 친구들에게 선보이며 교분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난에 대해 품평도 하고, 아름다움을 시로 읊고, 글로 남기고 ….
마음으로 키우는 난
“난을 키우려면 첫째가 배양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이 종자 선택입니다.”
그가 난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다.
그만큼 난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식물이다. 씨에서 생강모양의 뿌리가 형성되는 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이 생강근에서 싹이 터 촉을 틔우기까지의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린다.
“난은 마음으로 키워야 해요. 평생을 벗을 대하는 마음으로 난을 대했어요.”
난을 키우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연인을 대하듯 하고, 또 다른 이는 자식을 키우듯 한다. 공통점은 모두가 마음을 준다는 것. 김 고문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난을 보고 누군가가 '예쁘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 그 말 한마디가 난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는 “내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행복했고, 자식이 있어 즐거웠고, 난이 있어 항상 웃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괴산증평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